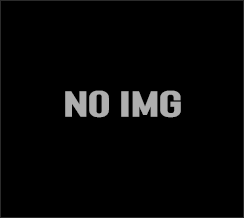사진=연합뉴스
새 정부에서 은행의 가계대출에 대한 새로운 자본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거나 은행이 주택담보대출를 내줄 때 추가 자본을 더 쌓도록 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가계부채 급증과 집값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자를 중심으로 규제했다. 이번에는 은행을 직접 규제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18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은행에 대한 새로운 자본 규제 도입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 또는 부문별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sSyRB) 도입이 거론된다. 이들 제도는 특정 부문, 특히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경우 은행이 해당 부문에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 규제다. 예컨대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시장에 과도한 자금이 유입될 경우, 은행은 위험에 대비해 더 많은 자본을 쌓아야 한다. 국정기획위는 부동산 경기 과열 시 대출을 조절하는 장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 국정기획위가 위원들에게 배포한 정책 해설서에도 이와 관련, "IMF도 지난 2020년 가계 부문 담보·무담보 대출에 대한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을 1~2년 내 도입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며 "유럽 각국에서도 활용되고 있다"고 언급됐다.
은행이 보유한 자산에 위험 수준을 반영한 '위험가중자산(RWA)을 상정할 때 주담대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 하한선을 올리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현재 국내 은행의 주담대 평균 위험가중치는 약 15% 수준이다. 국정기획위는 주담대의 위험가중치가 25%인 스웨덴 사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은행은 동일한 금액의 주담대를 실행하더라도 더 많은 자기자본을 확보해야 한다. 은행의 대출 여력이 줄어들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이를 통해 은행이 가계대출보다 기업대출에 자원을 더 배분하도록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자본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실물경제 리스크와 금융 리스크가 중첩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시도”라며 “다만 은행 입장에선 수익성이 높은 주담대 비중을 줄여야 하는 만큼 부담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이 중소기업과 동반성장하는 노력을 평가하는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도 도입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에 얼마나 대출을 많이 해주는지 등을 계량화해 점수를 매길 것으로 예상된다.
조미현/서형교 기자 mwise@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번주 포인트랭킹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 14,000상품권
- 23,000상품권
- 32,000상품권
 학입니다
학입니다
 600
600
 비가오는날
비가오는날
 500
500
 태산희님
태산희님
 400
400
 미국하키원툴
미국하키원툴
 400
400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글쓰기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