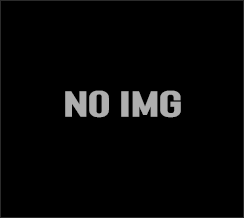곽노필의 미래창
‘호모 롱기’로 명명됐던 하얼빈 두개골
치석 DNA 분석하니 데니소바인과 동일

중국 하얼빈에서 발견된 ‘호모 롱기’ 두개골에서 DNA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호모 롱기는 고대 인류의 사촌격인 데니소바인으로 밝혀졌다. 허베이지질대 제공
네안데르탈인과 함께 현생 인류의 또 다른 사촌으로 꼽히는 데니소바인의 얼굴 특징을 짐작할 수 있는 두개골이 확인됐다.
2008년 시베리아 알타이산맥의 데니소바 동굴에서 손가락뼈 화석이 발견되면서 처음 존재가 드러난 데니소바인은 그동안 뼛조각들만 발견돼 정확한 모습을 추정하기 어려웠다. 이번 발견은 2010년 DNA를 통해 처음으로 데니소바인을 식별해낸 이후 15년간 가려져 있던 베일을 벗긴 셈이다.
중국과학원과 허베이지질대 공동연구진은 2021년 새로운 고대 인간종으로 잠정 분류했던 ‘호모 롱기’의 두개골에서 DNA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데니소바인으로 확인됐다고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와 셀에 두 편의 논문을 통해 발표했다.
당시 허베이지질대 연구진은 북동부 헤이룽장성 하얼빈에서 발견된 이 두개골을 분석한 끝에 “주인공은 14만6천년 전 몸집이 큰 50대 남성으로, 두개골의 해부학적 특징으로 보아 네안데르탈인보다 현대 인류와 더 가까운 멸종된 혈통으로 보인다”며 이 두개골에 ‘호모 롱기’라는 이름을 붙인 바 있다. ‘롱기’는 용이라는 뜻으로 두개골이 발견된 헤이룽장성(흑룡강성) 이름에서 따왔다.
당시 연구진이 파악한 이 두개골의 해부학적 특징은 눈 위쪽 뼈가 두껍고, 눈이 움푹 들어갔으며 코는 뭉툭하고 뺨은 납작했다. 또 넓은 입과 큰 이빨을 갖고 있으며 뇌의 크기는 현대 인류의 평균치보다 약 7% 더 컸다.

연구진은 두개골 화석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치아에서 치석(빨간색 원)을 떼어내 DNA를 확인했다. cell
단단한 치석이 DNA 안전하게 보존
그러나 첫 데니소바인 발견에 참여했던 중국과학원 고척추동물및고인류연구소 푸차오메이 박사는 이 두개골이 데니소바인일 수도 있다고 보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후속 연구로 호모 롱기의 두개골에서 DNA 채취를 시도했다.
그는 우선 두개골 화석 중 치아와 내이를 감싸고 있는 뼈에서 작은 조각을 떼어내 분석했다. 내이를 감싸고 있는 뼈는 사람 몸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단단한 뼈로, 유전물질이 잘 보존돼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진은 그러나 이곳에서 DNA를 찾는 데 실패했다.
연구진은 대신 뼈에서 발견한 95개의 단백질이 시베리아와 티베트, 대만에서 발견된 데니소바인 단백질의 특징과 같다는 걸 발견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데니소바인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되지 못했다.
푸 박사가 DNA를 검출한 곳은 유일하게 남아 있는 어금니에 붙어 있는 치석이었다. 치석이 켜켜이 쌓이는 과정에서 입안의 세포가 치석에 끼어들어갔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적중했다. 0.3mg의 치석에서 검출된 대부분의 DNA는 박테리아에서 유래한 것이었으나 구강 세포에서 유래한 것도 일부 있었다. 연구진은 “이를 분석한 결과 두개골의 주인공이 데니소바인이라는 걸 알아냈다”고 밝혔다. 모계로 유전되는 미토콘드리아 유전체에서 추출한 염기서열이 18만7천~21만7천년 전 시베리아 데니소바인과 매우 가까웠다. 연구진은 구석기 시대 치석에서 DNA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단단하게 굳어진 치석이 DNA를 오랜 세월 동안 안전하게 보존해주는 역할을 해준 셈이다.

데니소바인으로 확인된 ‘호모 롱기’의 생활 상상도. 허베이지질대 제공
40만년 전 네안데르탈인과 갈라져
이 두개골은 애초 1933년 일본이 세운 만주국 시절의 하얼빈에서 쑹화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건설에 투입된 한 농부가 땅을 파던 중 발견했다. 농부는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버려진 우물에 숨긴 뒤 85년 동안 비밀에 부쳤다가 2018년 임종을 앞두고서야 가족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다. 가족들은 곧바로 두개골을 수습해 허베이지질대에 기증했다.
과학자들은 현생 인류는 약 60만년 전 아프리카에 살았던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 모두와 공통 조상을 공유하는 것으로 본다. 이 가운데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 공통조상은 일찌감치 아프리카를 떠나 약 40만 년 전에 두 계통으로 갈라졌다.

데니소바인으로 확인된 호모 롱기의 얼굴 복원도. 허베이지질대 제공
네안데르탈인은 중동에서 서유럽으로 이동했고, 데니소바인은 시베리아와 우랄알타이산맥, 동남아 지역으로 이동해 살다가 네안데르탈인은 4만년 전, 데니소바인은 3만~5만년 전에 멸종한 것으로 추정된다. 오늘날 동남아시아와 멜라네시아 인구는 최대 5%의 데니소바인 DNA를 보유하고 있다.
연구진은 이번에 확인한 하얼빈 두개골은 데니소바 동굴에서 발견된 것 중 가장 오래된 20만년 전의 화석과 같은 계통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는 데니소바인이 당시 아시아에서 매우 넓은 지역에 걸쳐 살았음을 보여준다. 푸 박사는 뉴욕타임스에 “모든 유전적 다양성을 고려할 때 하얼빈 두개골이 전형적인 데니소바인 얼굴인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며 “현재로선 하나의 사례일 뿐”이라고 말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로 데니소바인의 형태학적 특징을 알아낸 만큼 앞으로 고대 DNA가 없더라도 데니소바인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연구진은 예컨대 중국 윈난성의 다리, 랴오닝성의 진뉴산, 안후이성의 화룽동에서 발견된 화석의 주인공은 두개골 형태로 보아 데니소바인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논문 정보
146,000-year-old Harbin cranium.
DOI: 10.1016/j.cell.2025.05.040
The proteome of the late Middle Pleistocene Harbin individual.
DOI: 10.1126/science.adu9677
곽노필 선임기자 nopil@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번주 포인트랭킹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 14,000상품권
- 23,000상품권
- 32,000상품권
 태산희님
태산희님
 2900
2900
 학입니다
학입니다
 2800
2800
 풀카
풀카
 2700
2700
 언더달아달아
언더달아달아
 2200
2200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글쓰기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