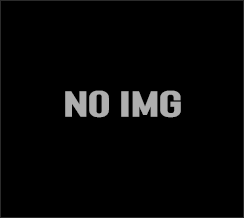최신현 KAIST 교수 연구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진이 전력 소모량을 15배 줄인 '상변화 메모리'를 개발했다. 상변화 메모리는 디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장점을 모두 가진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다. 왼쪽부터 최신현 교수, 박시온 석박통합과정 연구원, 홍석만 박사과정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

국내 연구진이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술로 꼽히는 ‘상변화 메모리’ 소자의 제작 비용과 전력 효율을 높일 방법을 찾았다. 기존 메모리 반도체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대량의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뉴로모픽 컴퓨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최신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은 4일 기존 메모리 반도체를 대체할 ‘초저전력 차세대 상변화 메모리 소자’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상변화 메모리는 열에너지로 물질의 상태를 비정질과 결정질로 바꾸고, 저항 변화를 이용해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의 반도체 소자 기술이다. 데이터를 읽고 쓰는 속도가 빠르고 내구성이 높아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로 주목 받고 있다. 특히 현재 사용 중인 디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장점을 모두 지녀 인공지능(AI) 구현에 필요한 뉴로모픽 컴퓨팅 성능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그러나 초미세 반도체 노광 공정이 필요하고 소모 전력이 크다는 문제로 상용화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자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 초미세 공정을 이용한 방식이 주목 받기도 했으나 소비 전력이 낮아지는 효과보다 제작 비용과 난이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KAIST 연구진은 노광 장비 없이도 ㎚(나노미터, 1㎚는 10억분의 1m) 크기의 상변화 필라멘트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해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 제작 비용을 낮추는 것은 물론 소모 전력도 크게 낮추는 데 성공했다.
이번에 개발한 상변화 메모리는 초미세 노광 공정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해 소비 전력이 15배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노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투과전자현미경(TEM)을 이용해 상태 변화 과정도 확인해 작동 과정을 증명하는 데도 성공했다.
연구진은 앞으로 성능과 집적도를 높이기 위한 3차원(3D) 수직 메모리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최근 인간의 뇌를 모방한 뉴로모픽 컴퓨팅에 적용해 적은 전력으로도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AI 반도체 구현도 가능하다는 것이 연구진의 전망이다.
최 교수는 “초저전력 상변화 메모리 소자는 기존의 연구 방향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비용과 에너지 효율을 대폭 개선할 수 있다”며 “물질 선택이 자유로워 고집적 3차원 수직 메모리 및 뉴로모픽 컴퓨팅 시스템 같은 다양한 응용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 이날 발표됐다.
참고자료
Nature, DOI: https://doi.org/10.1038/s41586-024-07230-5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번주 포인트랭킹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 14,000상품권
- 23,000상품권
- 32,000상품권
 미국거주펨붕
미국거주펨붕
 2000
2000
 대단하다축리웹
대단하다축리웹
 1900
1900
 태산희님
태산희님
 1900
1900
 어린사슴의눈망울
어린사슴의눈망울
 1900
1900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글쓰기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