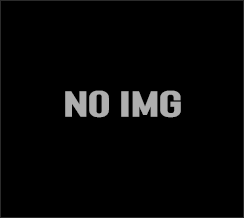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2일차
저출생 정책은 돈보다 삶의 질·계층이동 회복이 핵심
해답은 지방에…지역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이데일리 이소현 이정윤, 나은경, 이배운, 이윤화, 조민정, 박소영 기자] 저출생과 지역소멸이라는 이중 위기를 마주한 한국 사회에서 단순히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앞으로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를 위해선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만큼 잘살 수 있을 것이란 희망 아래에서 수도권 집중 정책에서 탈피해 지방에서 해답의 열쇠를 찾아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그레고리 액스 어반 인스티튜트 조세 및 소득지원 부소장이 19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지역별 인구대책 차별화’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부모세대보다 못사는 자녀세대…저출생 필연적 구조
1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이데일리-정책평가연구원(PERI) 스페셜 심포지엄’의 세션5 ‘지역별 인구대책 차별화’에서 전문가들은 현금성 지원만으로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인구 위기를 막지 못한다며,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춘 지방 분권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레고리 액스 미국 어반 인스티튜트 조세·소득지원 부소장은 “부모보다 더 잘 사는 자녀 세대는 이제 절반에 불과하다”며 “사회적 계층 상승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면 출생률 저하는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진단했다.
실제 미국에선 출신 배경이나 계급·인종·성별과 상관없이 누구나 노력과 능력에 따라 더 나은 삶을 성취하는 것의 상징이었던 ‘아메리칸 드림’은 옛말이 됐다. 액스 부소장은 “1940년대에 태어난 미국인의 90%가 부모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렸지만, 1980년대생 중 그러한 비율은 50% 수준에 불과하다”며 “사회적 계층 상승의 통로가 점차 좁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고민은 한국사회도 피할 수 없는 문제다. 권혁주 한국행정연구원장도 “우리나라는 60년 이상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해왔는데 과연 부모님 세대보다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다”며 “단순히 ‘웰빙’의 문제라기보단, 주변의 다른 사람보다 잘 사는 ‘사회 속에서 나의 위치’에 대해 더 많이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돈보다 삶의 조건 중요…계층 상승 가능한 사회 만들어야
이영 조세재정연구원장은 “한국은 이미 다양한 저출산 정책을 시행 중으로 출산장려금, 주택 특별공급, 세제 혜택까지 다 해봤지만, 출생율은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이라며 “청년들이 경쟁적인 사회환경 속에서 결혼과 양육의 여유를 잃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정부가 수백 조원의 예산을 쏟아 전방위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저출생 문제는 더 악화하고 있다. 1960년대 전쟁 직후 베이비붐 등으로 약 6.0명에 달하던 우리나라 합계출생율은 1970년대 산아제한 정책을 시작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1984년 1명대에(1.74명) 진입했고, 2005년엔 초저출생(1.09명)에 접어들어 2018년 0.98명으로 사상 첫 1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합계출생율은 0.75명으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0.72명)대비 반등하긴 했지만, 올 1분기 기준 0.82명으로 여전히 1명 미만인 상황이다.
권혁주 한국행정연구원장은 “출산은 개인의 결정이지만, 사회 전체가 계층 상승의 가능성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 선택은 당연히 줄어든다”며 “출산 회피는 젊은 세대의 합리적 선택이자 사회 구조가 그렇게 유도한 결과이기에 웰빙 중심의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생률 회복 정책의 해법은 지역·지방 중심
저출생을 비롯한 한국 사회가 직면한 인구 문제의 해법으로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 대신 지역 특색에 맞춘 각 지방자치단체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액스 부소장은 사회적 계층 상승의 단절이 저출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을 통해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처방으로는 구조적 불평등을 해결할 수 없다”며 “지방정부·시민사회·민간이 함께 설계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진권 강원연구원 원장은 강원도의 실증 데이터를 토대로 “현금성 지원은 지역 인구 증가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료, 교통, 보육 등 삶의 인프라가 갖춰질 때 출생율이 높아졌다”며, 강원 화천군이 출생률 1.4명으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한 사례를 소개했다. 또 고령층 유입과 관련해 삼척시가 추진 중인 의료 중심 도시 전략, 은퇴자 세제 혜택 정책 등도 새로운 인구 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하며 “정년 후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이 조성되면 지방으로의 인구 이동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도 “수도권 집중 해소만으로 출산율이 0.44명 증가할 수 있다”며 “지방은 남성 과잉, 수도권은 여성 과잉이라는 인구 성비 불균형도 심각하다”고 지역 균형발전과 출생률 회복이 맞닿아 있다고 짚었다.
스티븐 마틴 어반 인스티튜트 노동·인간서비스·인구센터 선임연구원은 지방 중심의 출산 정책 설계의 핵심은 ‘삶의 조건’이라며 “첫째 자녀보다 둘째 자녀 출산 시 부담이 급격히 커진다는 점, 결혼과 가족 형성을 고려하는 연령층의 이주 패턴 등을 함께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사회적 격차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 제도의 개편도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트레이시 고든 어반 인스티튜트 부소장은 “지역간 빈부격차가 완화됐다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지금보다 높았을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자원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소현 (atoz@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번주 포인트랭킹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 14,000상품권
- 23,000상품권
- 32,000상품권
 미국거주펨붕
미국거주펨붕
 2300
2300
 곽가봉효
곽가봉효
 2300
2300
 어린사슴의눈망울
어린사슴의눈망울
 2100
2100
 대단하다축리웹
대단하다축리웹
 2100
2100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글쓰기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