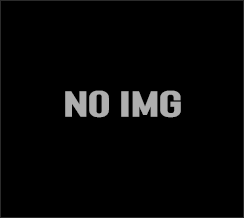[MT리포트]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가는 길①
[편집자주]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가 뚫린다. 수도권의 부족한 전기를 호남 재생에너지 단지에서 끌어오는 국가 전력망 구축 사업이다. 그 길에 놓여 있는 걸림돌을 짚어 보고 솔루션을 모색한다.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개념과 과제/그래픽=김지영
이재명 대통령 공약대로 2030년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개통하려면 향후 약 4년 내 'GW(기가와트)급 변환설비'를 반드시 국산화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의 해외 기업만 보유한 이 설비를 2030년까지 수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서다. 정부는 국산화를 지원할 계획이지만 기한 내 성공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당초 2031년으로 예정했던 1단계 호남-수도권 HVDC(초고압직류송전) 송전망 구축 사업을 1년 앞당겨 2030년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당초 한전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서 호남-수도권 사업을 3단계(1단계 2031년, 2단계 2036년, 3단계 2038년)로 추진하기로 했지만 이 대통령의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공약을 반영, 1단계 일정을 앞당겼다.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는 호남권 신재생에너지 단지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에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전력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문제는 이 사업에 필요한 변환설비가 국내에 없다는 사실이다. 변압기·컨버터 등으로 구성된 변환설비는 송전망 시작·중간·끝 지점에서 전압을 조정하거나 교류·직류를 서로 바꾸는 등 역할을 한다.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는 대용량 전기를 안정적으로 먼 곳까지 보내야 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라 종전 기술보다 고도화된 GW급 전압형 HVDC 변환설비가 필요하다. 국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력기기 업체들이 있지만 아직 이 설비를 공급할 능력은 없다.
GE·지멘스·히타치 등 소수의 해외 전력기기 업체가 역량을 갖춘 곳들이다. 하지만 2030년까지 이들로부터 설비를 수입하는 것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 지적이다. 세계적인 전력망 신설·교체 붐으로 변환설비 시장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또 해외 전력기기 업체는 보통 수요처와 '프레임워크'라는 방식의 계약을 맺어 수년 동안의 설비 공급을 미리 약속하기 때문에 추가 발생 물량 대응이 어렵다. 업계 한 관계자는 "GW급 전압형 HVDC 변환설비를 수입하려면 8년 가까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설비 공급이 가능한 기업을 찾더라도 공공 계약 규정이 가로 막는다. 기업이 공공사업에 참여하려면 최저가 경쟁 입찰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쉬울 게 없는' 해외 전력기기 업체로선 여기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또한 이들은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프레임워크 계약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수용하려면 정부가 현행 공공 계약 규정을 고쳐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국산화 지원에 착수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에 '500kV(킬로볼트) 전압형 HVDC 변환용 변압기 R&D(연구개발) 사업' 예산 60억원이 담겼다. 업계는 향후 다른 변환설비 국산화 과제도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다.
2030년까지 국산화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과 어렵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기업이 맨땅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라 기간 내 국산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중장기 시각에서 국산화는 꼭 필요하다"면서도 "일부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4년 내에 변환설비를 모두 국산화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번주 포인트랭킹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 14,000상품권
- 23,000상품권
- 32,000상품권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글쓰기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