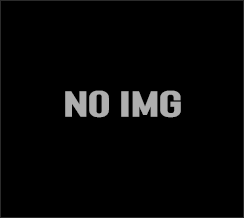(47)공직 인사
■ 순자의 ‘순자’
관리는 ‘백성의 선생’
어진 사람 외면하고
자기편만 등용해 문제
성인·군자 못 뽑는다면
소인배에 맡기기보다
어리석은 사람 택하라

게티이미지뱅크

순자는 맹자와 더불어 공자 사후 유학의 양대 산맥을 이루었던 학자였다. 그는 분열된 전국시대가 통일제국의 시대로 수렴되어 가던 시대를 살았다. 당시 그는 자타 공인 당대 최고의 지성답게 이러한 시대 추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통일제국의 실현과 운영에 대한 설계도를 그렸고, 이를 순자라는 저술에 담아냈다.
여기에는 통일제국을 일궈내고 유지, 발전시켜가는 데 필요한 것들에 대한 순자의 통찰이 풍부하게 담겨 있다. 관리 임용에 대한 사유도 그중 하나였다. 그는 훌륭한 군주가 되지 못하는 이유의 하나로 관리 임용을 둘러싼 군신 모두의 잘못을 들었다. 군주가 공정하지 못하고 신하는 충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군주는 어진 이를 외면하고 자기편 사람들만 등용하고, 신하는 자리를 다투면서 어진 이들을 시샘한다. 이것이 군신이 힘을 합쳐 일하지 못하는 이유다. 군주는 어찌하여 시야를 넓히지 않는가? 자기와 친하든 말든, 사회적 신분이 높든 낮든,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오직 진실하고 유능한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가?(순자)
여기서 “진실하고 유능하다”는 것은 “어진 이를 존중하고 능력 있는 이를 임용한다”는 뜻의 존현사능(尊賢使能)이라는, 공자 때 이미 도도한 전통으로 자리 잡은 관리 임용 준칙을 가리킨다. 도덕역량과 실무역량이 관리 임용의 양대 기준이라는 뜻이다.
한자권에는 이른 시기부터 ‘군사(君師)’라는 관념이 있었다. 훗날 통일제국을 일궈낸 진시황은 이를 ‘이사(吏師)’로 확대했다. 군사는 “군주가 곧 선생”이라는 뜻이고 이사는 “관리가 곧 선생”이라는 뜻이다. 둘 모두 군주와 관리는 모름지기 백성의 선생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실무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관념의 소산이다. 실무역량의 구체적 내용은 당연히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그 수준은 자신이 맡은 실무 분야의 선생이라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어야 하는, 적어도 전문가 수준은 돼야 한다는 뜻이다.
도덕역량도 구체적 내용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다만 공직을 맡는다는 것은 동일한 만큼, 공사를 구분해야 한다는 기본 위에 그때그때 시대와 사회에 절실하게 필요한 도덕역량을 갖춰야 한다. 지난 시절 중시했던 “수신제가” 같은 도덕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로 치자면 공감능력, 협업능력, 의사소통능력, 갈등조정능력, 다문화능력 같은 도덕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도덕역량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것은 아무리 법과 제도에 의거하여 개혁을 한다고 해도, 그것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공사 구분할 줄 모르고 이 시대가,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도덕역량을 갖추지 못했다면 아무리 법과 제도가 훌륭하다고 해도, 실무역량이 출중하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는 실무역량을 앞세우면서 도덕역량은 그냥저냥 넘어가고 있다. 급기야는 도덕역량이 부실함에도 전에 있던 관리들에 비하면 그래도 나은 편이라며 실무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주자고 한다. 국민에게 사과 한번 하고 넘어가면 된다고도 한다. 그러나 남이 크게 도둑질했다고 하여 내가 저지른 소소한 도둑질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사과도 필요하지만 당연히 도덕적·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

옛날 송나라 때 사마광이라는 학자가 있었다. 그는 성인, 군자와 함께 일할 수 없으면 어리석은 자와 일함이 소인배와 일함보다 단연코 낫다고 했다. 소인배는 공직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취하는 발판으로 악용해먹기에 충분한 역량을 갖추었지만, 어리석은 이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으니 특히 공무는 차라리 어리석은 이와 함께하는 것을 택해야 한다고 했다. 도덕역량을 경시하고 실무역량만 앞세웠을 때 나타나기 마련인 정관계의 적폐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었던 것이다.
김월회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교수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번주 포인트랭킹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 14,000상품권
- 23,000상품권
- 32,000상품권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글쓰기
글쓰기